- 웹진에 실린 글의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 02-708-2293 FAX 02-708-2209 E-mail : weekly@gokam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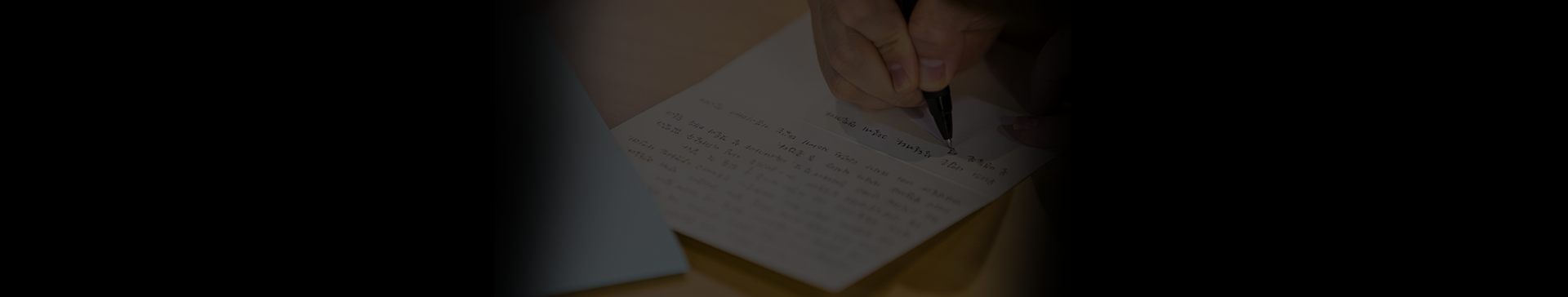
이상하게 따뜻했던 공모사업의 추억
예술행정가들이 말하는 예술행정② 글: 공민혜_용인문화재단 용인어린이상상의숲 대리
글: 공민혜_용인문화재단 용인어린이상상의숲 대리
 예술경영 463호_2021.4.8.
예술경영 463호_2021.4.8.
2015년 3월, 대학에서 예술경영과 도예를 전공했던 나는 예술경영은 ‘블루오션’이라는 네 글자만 기억한 채 공공기관의 중간지원조직에 덜컥 입사했다. 첫 직장인 데다, 체계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살아왔던 나에게 예술행정은 정말이지 미지의 세계였다. 걸음마 단계의 행정 초보는 회의 식비 지출 기안을 쓰는 데 무려 반나절을 썼고, 지출 건마다 따라 오는 네다섯 개의 서류 중 한 가지씩은 꼭 빼먹었다. 느린 업무 속도를 감추려고 퇴근 후에는 카페로 다시 출근해 나머지 공부를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헤매던 초보자에게 운 좋게도, 날카로운 모습 뒤에 말랑함이 한가득인 사수, 모든 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동료, 화난 모습이 가끔 무섭지만 어떤 일에도 진심을 담아내는 센터장님이 나타나며, 입사 2년 차의 나는 제법 능숙한 담당자가 될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모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서 접수부터 서류 심의, 인터뷰 심의, 선정, 정산 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매년 초, 선정의 기쁨(안도?)과 탈락의 상처를 경험하는 단체 및 기관(이하 단체)들이 생겨난다. 종종 미선정된 단체 담당자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당혹스러움이 담긴 목소리로 탈락이유를 묻는다. 그때 마다 담당자인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끈거림을 느끼며 황급히 심사평을 뒤진다. 더듬더듬 난감한 목소리로 심의 내용을 전달하면 긴 호흡을 내뱉으며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통화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종일 마음이 어렵다. ‘선정’과 ‘미선정’의 차이가 마치 이분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전체를 ‘성공’과 ‘실패’로 낙인찍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계속 쿡쿡거린다. 아직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단체들에게는 더욱이.
당시 심의, 컨설팅에 함께해주신 선생님들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선정단체는 지속적인 사업 실행이 가능하지만, 미선정 단체들은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매년 지원사업의 고배를 마신다. 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철학은 깊어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결국 지원사업에서 이탈되어 간다.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이 과연 건강한 구조의 지원사업인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매번 반복되는 지원사업의 견고한 구조에 작지만 분명한 금을 내는 계기가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지원사업 담당자 3인의 고민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이어졌다.
“지원사업은 왜 늘 경쟁해야 할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항상 강조되는 각기 다른 속도와 다양함의 존중이 단체에도 적용될 수는 없는 걸까?”
“우리 스스로 단체의 역량과 배경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공모 절차를 따르고 있다 자신할 수 있을까? 단체에 진짜 필요한 지원은 뭘까?”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정책처럼 단체의 경험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심의 기준은 ‘사업 내용의 우수성’보다 ‘문화예술교육 철학의 공유와 학습에 대한 적극성(의지)’, ‘사업 내용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단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낸 공고에는 기대 이상으로 여러 단체가 응답해 주었고,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 ||
| 꿈다락 기획 공모 ‘마중물 시간’ 현장 사진 출처: 경기문화재단, 촬영: 장기훈 |
|||
‘다시, 꿈다락’과 함께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중물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프로그램을 세련되게 다듬는 일방적인 컨설팅 대신 기관 담당자, 전문가, 운영단체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예술(교육)을 공통의 업으로 삼는 동료로서 서로를 마주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각자가 가진 무게를 내려놓으니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 교육활동에 담고 싶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신나게 쏟아 낼 수 있었다. 누군가 속 깊이 담아 두었던 진심을 이야기하다 울음을 터뜨렸을 땐, 당황스러웠지만 신기하게도 공감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내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심들을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서로가 드러낸 진심은 스스로에게도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다시 짚어보게 하는 힘이 되는 듯했다.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엔 처음의 긴장된 표정 대신 저마다의 가장 멋진 표정들이 떠올랐다. 의외였지만 서로를 마주하는 눈빛에는 끈끈함 비슷한 것도 묻어났다. 이젠 넋두리 섞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것 같았다. 나에게도 작은 변화들을 계속해 나갈 기운이 생겨났다. 어쩐지 든든해진 마음이었다. 홀로 되돌아보며 미화한 건 아닌지, 그때의 마음들은 어땠는지 궁금해 함께한 이들의 회고글을 다시 찾아봤다.
 | |||
| 꿈다락 기획 공모 ‘마중물 시간’ 현장 사진 출처: 경기문화재단, 촬영: 권하형 |
|||
사업과 함께한 선생님들의 회고에서 보듯 ‘다시, 꿈다락’에선 왜 따뜻함이 느껴졌던 걸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는 옆 팀 팀장님이 스치듯 했던 말을 꽤 진지하게 마음에 품었던 것 같다. “문화예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그 일도 문화예술답게 하는 게 중요해”라는 말이 계기가 되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인 우리 또한 ‘문화예술교육답게’ 일하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었고, 질문에 대한 새로운 방향 찾기를 큰 망설임 없이 시도해볼 수 있었다. 그리곤 한 사람 마다의 속도와 방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실수할까 두려워 매일 얼어있던 행정 초보를 이끌어주었던 나의 동료들처럼. 그렇게 조금씩 따뜻해졌던 건 아니었을까.

공민혜는 “이왕이면 잘 먹고 살 수 일이 뭘까?” 하며 어린이미술관, 문화행정과 정책, 백수,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문화예술기획에 조금씩 발 담가왔다. 요즘은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는 모든 일에 두리번거리고 있다. 최근 가장 설레고 어려운 일은 점심 메뉴 고르기다. ‘꿀벌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활동 중이다.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