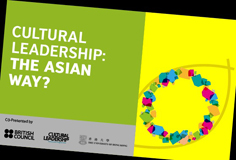

▲ Mitsuhiro Yoshimoto의 일본문화 리더쉽 발제 모습 (출처_British Council Hong Kong 트위터)
|
지난 7월 말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영국문화원 주최 행사인 <아시아적 문화리더십(Cultural Leadership: The Asian Way)>에 패널로 다녀와서 참관기 비슷한 걸 쓰기로 응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나에게는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편안하지 않은 탓이다. 우선 적절한 한국어 단어로 번역해 말하려는 순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배웠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지 윗동네의 용례가 머릿속을 스치며 일차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조금 더 머리가 커서 느끼게 된 그 뭔지 모르겠던 아랫동네의 용례에서 느낀 강압성과 권위성 역시 못지않아 다시 한 번 재검열을 하게 된다. 게다가 조직 이론을 다소 심각하게 배운 이후로는 현대사회에서의 ‘리더십’이 갖는 중의성 때문에 더욱이 어느 한 단어로 콕 집어서 번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나처럼 ‘리더십’에 대한 문화적 번역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리더십’에다 온갖 수식어를 붙여 사용한다.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최근에는 ‘깨알 리더십’까지….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지도력’, ‘통솔력’, ‘선도력’ 같은 멀쩡한 한글을 뒤로 하고 이렇게 멋있게(?) 쓰이고 있고, 나는 이 멋진 말을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 문화예술에 붙여서 지면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제목에서부터 딴죽을 걸기로 했다. ‘문화예술계에서의 리더십은 무엇인가?’라 쓰는 대신 ‘문화예술계에서의 리더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삐딱선을 탄 것이다. 이 결심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문화리더십(Cultural Leadership)’ 포럼에서 진행되었던 세션 1의 토론 내용이다.
클로어표 문화리더십의 아시아 버전
세션 1은 ‘아시아 문화의 가치(The Value of Culture in Asia)’라는 다소 포괄적인 주제로 시작되었다. 먼저 프레데릭 마오(Frederic Mao, Performing Arts Asia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는 정치,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세계화가 문화예술계에 가져오는 이익과 피해, 문화적 정체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문화 리더십의 모양새는 과연 무엇인가의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토론자인 데이비드 탕(David Tang, 홍콩의 유명 디자인 브랜드 상하이 탕(Shanghai Tang)의 설립자이자 홍콩 문화계의 유력 인사)은 매우 전통적인 입장에서 마치 영국예술위원회 설립 초기에 나올 법한 주장을 쏟아냈다. “문화적·예술적 수월성(excellence)만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아래로부터 위까지 동조를 구하며 부지런하게 다닐 것도 없다, 스티븐 호킹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도 과학계의 리더임을 누가 부인하는가, 결국 문화예술에서 시대를 ‘선도’하고 대중을 ‘통솔’하는 것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행위와 그 결과뿐이다.“
아시아권의 문화교류에 작지만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아시아링크아츠(Asialink Arts)의 디렉터 레슬리 얼웨이(Lesley Alway)는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본 아시아에서의 문화 리더십의 가능성과 특수성을 매우 온건하게 주장했다. 사회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토론의 중심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질문을 던지는 존 투사(John Tusa, BBC World의 본부장 및 바비칸 센터의 CEO 역임)는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리더십 지원 프로그램인 클로어 리더십 프로그램(Clore Leadership Program)의 대표로서 문화예술에서의 리더십이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논점을 더 끌어내려 하는 것 같았다. 세션 1 이후의 주제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브랜딩을 할 때 등장하는 리더십의 이슈를 다루었던 ‘아시아의 문화브랜딩(Branding Culture in Asia)’,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협업 및 협력의 조건에 대해 얘기했던 ‘아시아 문화리더십의 접근(Approaches in Cultural Leadership in Asia)',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사회적 접점을 늘리는 활동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던 ‘아시아의 문화적 기업가 정신과 혁신(Cultur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in Asia)’,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문화예술인 및 활동가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던 ‘아시아의 문화적 역량 기르기(Nurturing Cultural Talent in Asia)’등을 포괄하였다.
|

▲ 세션 2 패널토론 모습 (출처_British Council Hong Kong 트위터)
|
고용주여, 문화 리더십(Cultural leadership)을 허하라
포럼의 서두에 촉발되었던 문화예술의 가치 논쟁은 행사 다음 날 재개된 패널들 간의 워크숍으로까지 이어져서 무엇이 문화예술의 리더십인가, 과연 누구를 문화예술의 리더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를 거쳐 종국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리더십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 있는가 혹은 타당한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이루어졌다. 리더십의 정의, 분야, 층위 등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즉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의 노출, 교류를 통한 자극과 연대(및 네트워크) 형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대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포럼 막간을 이용해 존 투사(John Tusa)에게 ‘클로어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소한 영국이 생각하는 문화예술 리더십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한숨 섞인 부러움이 들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리더십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자 개개인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짜인 구조도 훌륭하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현실화하는 세부 설계나 참여 문화예술 기관들의 조직문화가 돋보였다.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대체인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로어더프필드(Clore-Duffield) 재단에서 참가자가 소속된 기관의 인건비를 보존해주는 배려라든지,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가 새로운 영역 탐색을 위해 근무하게 되는 3개월간의 모든 비용(인건비 포함)을 해당 연수기관에서 부담하는 등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물 풍선 같은 한국 문화기획자 혹은 종사자들의 일인당 업무 부담을 생각할 때, 이런 배려가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 한들 몇 명의 대체인력 충원을 고려해야 겨우 한 사람의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곳에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리더(?)를 조직의 구성요소만이 아닌 업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지원서에 서명해줄 수 있는 고용주의 존재 혹은 기관의 조직문화에 생각이 미치면서, 한숨과 함께 비로소 서울행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음이 생각났다.
|
 홍기원_[Weekly@예술경영] 편집위원
홍기원_[Weekly@예술경영] 편집위원
 NO.226_2013.08.29
NO.226_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