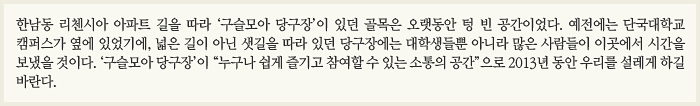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계는 서구 현대미술과의 동시대성을 보여주면서도 IMF를 겪으면서 대안공간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안공간은 1970년대 뉴욕 소호를 중심으로 미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자본주의화 되고 상업화되는 현대미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뚜렷한 명분하에서 태동하였다. 서구의 대안공간은 자생적인 독립성을 중요시하면서도 비영리재단(not-for-profit organization)에 지급하던 국가 및 연방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다.
|

▲ MoMA P.S.1
|
대림미술관이 프로젝트 공간으로 운영하는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은 성격적으로 보면,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과 연계되어 있는 PS1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모마와 PS1의 경우는 처음부터 두 개의 공간이 서로 연계된 현대미술 전시공간은 아니었다. PS1은 모마와 달리, 대안공간의 성격을 띠고 1976년에 개관한 대안공간으로,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Long Island City)에 있던 폐교를 활용한 장소였다.
대안공간, 프로젝트성 전시 공간은 동시대 미술을 전시 형식으로 풀어낸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 현대미술에서 대안공간은 제도(institution)로 자리 잡은 미술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전시와 담론들을 확장시켜왔다. 예를 들면, 1977년 가을 아티스츠 스페이스(Artists‘ Space)라는 뉴욕 소호의 대안공간에서 열렸던 <pictures>는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Crimp)가 기획했던 전시로 1979년 큐레이터 스스로 전시에 대한 평을 『옥토버(October)』에 실어 당시로서는 신세대작가들이었던 신디 셔먼(Cindy Sherman), 세리 레빈(Sherrie Levine),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등을 뉴욕 미술계에 알렸다. 이미지의 귀환을 알렸던 이 전시는 전통회화가 아닌, 사진,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여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그림(picture)‘, 즉 ‘이미지’의 귀환을 알렸다. 대안공간들은 주류미술계에서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던 동시대적인 현장성을 빠르게 흡수했으며, 당시에는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슈를 대변하던 미술가들 모두, 동시대 미술에 기여한 정신을 인정받았다. 이런 대안공간은 재정 등의 문제로, 성격상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PS1이 폐교의 공간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해 화이트 큐브인 미술관, 갤러리의 사각 공간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장소특정형) 설치,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었듯이, 대림미술관의 ‘구슬모아 당구장’도 기본적인 건물 구조 등은 그대로 두면서 대림미술관에서 보여주지 못한 젊은 미술가들과 디자이너, 건축가들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구슬모아 당구장’은 2012년도 공모를 통해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2013년 한 해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
▲ D PROJECT SPACE 구슬모아당구장 |
대림미술관은 그동안 타 미술관과 차별화를 두면서, 사진과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가구나 공예 등)을 비롯해 과거 한국미술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야를 확장시키며 그 외연을 확장해왔다. 결국 이러한 프로젝트성 공간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현대시각 예술의 동시대성을 새롭게 실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10년 이상 축적되면 대림미술관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현대미술의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PS1 (현재는 MoMA PS1으로 불림)의 역사는 1971년 알라나 하이스(Alanna Heiss)가 설립한 예술과 도시 자원을 위한 인스티튜트(Institute for Art and Urban Resources Inc.)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스는 초창기에 작업실이 없거나 전시공간이 없는 미술가들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건물들이나 공간을 제공하였다. 1971년 건축을 공부한 고든 마타-클락(Gordon Matta-Clark)이 브루클린 다리 밑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의 허가를 받아주거나 1976년 현재의 PS1공간이었던 폐교에 장소특정형 전시인 ‘Rooms‘ 그룹 전시를 기획한 이도 하이스였다. 2000년 이후 PS1은 뉴욕 모마와 연계되어 대안공간의 성격보다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현대미술관으로, 공간설치나 퍼포먼스, 건축 프로젝트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주변부에 머물렀던 것이 1990년대 이후에는 중심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마와 PS1은 큐레이팅과 행정면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림미술관과 ‘구슬모아 당구장’ 프로젝트 공간 또한 큐레이팅과 행정구조의 차이를 통해 독자적인 성격을 구축하여야 일시적인 대안공간을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프로젝트성 전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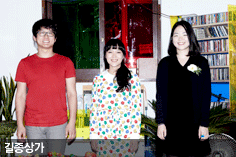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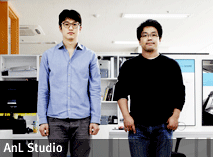 |
 |
|
▲ 사진제공_FACE |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들을 비롯해 건축, 음악, 문학,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2013년 시리즈는 <10 Young Creators>로 불리는 릴레이식 전시들이다. 2013년 첫 프로젝트를 출발시킨 AnLstudio(안기현, 이민수)는 2009년 인천 송도시에 <오션스코프(Ocean Scope)>를 디자인하였고, ‘구슬모아 당구장’에서는 사라지는 소멸적인(dissolve) 구축물을 선보였다. 공기와 맞닿으면서 형태가 변하는 물질들은 비정형적인 일시적 설치로 존재한다. 패션디자이너 최철용이 이끄는 CY Choi는 순수예술과 디자인 등을 공부한 협업 팀이 이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최근 홍익대 내에 있던 (구)홍익부속초등학교를 초현실주의적인 ‘아트 클래스룸’으로 변형시켰다. 이들 외에도, 길종상가, 김소현/이윤정, 박진택, 유희경, 장성은, 정소영, 조웅의 프로젝트성 실험전은 예술가 1인의 아우라보다는 장르와 매체의 융합과 소통을 시도하는 수평적인 협업이 될 것이다.
|

|
한남동 리첸시아 아파트 길을 따라 ‘구슬모아 당구장’이 있던 골목은 오랫동안 텅 빈 공간이었다. 예전에는 단국대학교 캠퍼스가 옆에 있었기에, 넓은 길이 아닌 샛길을 따라 있던 당구장에는 대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대림 미술관이 야심차게 시작한 ‘구슬모아 당구장’이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가 말하는 ‘보보(bobo, 부르주아-보헤미안/bourgeois-bohemian의 약자인 신조어)’를 위한 대안공간이 아닌, ‘구슬모아 당구장’이 공언하듯이, “누구나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2013년 동안 우리를 설레게 하길 바란다. 예술의 역사는 순수매체를 옹호해왔지만,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디자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프로젝트 성으로 풀어내는 ‘구슬모아 당구장’이 기획한 2013년 프로그램이 현대시각예술, 건축, 문학, 음악 등을 한데 모아 우리가 일상에서 미적인 것들 재발견할 수 있도록 대안적 플랫폼을 형성해주리라 기대해본다.
[관련 링크]
‘구슬모아 당구장’ 공식 홈페이지
|
|
|
|
|
 |
필자소개
뉴욕대학교에서 예술기획과 미술사, 비평이론을 공부했으며, 뉴욕대학교 인스티튜트 오브 파인 아츠(Institute of Fine Arts, New York University)에서 미술사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SUNY)의 미술사학과에서 조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조교수이다. |
|
|
|
|
 정연심_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정연심_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NO.205_2013.03.14
NO.205_201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