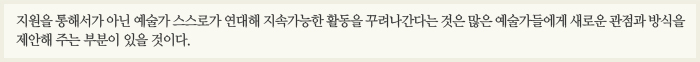|
|
지난 11월 15일, 성미산마을극장에서는 한일 지역예술교류 포럼으로 ‘지역예술 공동체, 도시에서의 정주’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일본 오사카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망토마을과 관계를 맺어온 만화가 고경일 씨와 그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 아망토마을을 직접 방문한 성미산마을이 아망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초청을 계기로 참여연대 그림者와 성미산마을의 주최로 한일 지역예술교류 프로젝트 ‘아망토마을,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상상’이 열렸고 《지진피해 일본 어린이, 조선학교 어린이 돕기 그림展》과 아망토 예술인과 함께 하는 댄스 워크숍이 함께 진행되었다.
|
  |
도시에서의 정주를 위한 대안적 노력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아망토의 예술가와 워크숍 참가자들의 공연, 그리고 한받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후 진행된 포럼에서는 아망토마을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준 아망토(이하 준, 아망토 사람들은 이름 뒤에 ‘아망토’를 붙여서 이름과 함께 사용함)가 마을 조성의 배경과 과정, 마을 운영의 철학과 원리, 활동 등을 소개했다. 준은 아망토마을을 시작하기 전, 예술을 통한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의 총괄기획자로 참여했었다. 그런데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상가와 상권이 활성화되자 건물주는 상가임대 재계약을 거부했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공공지원사업과 상업성에서 오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 준은 자력으로 예술가의 삶을 존속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춤추고 연기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이 될 작은 카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사카 역 인근의 130년 된 오래된 목조 건물이 카페로 바뀌면서 아망토마을이 시작된 것이다. 준은 카페 오픈을 위한 공사 자체를 퍼포먼스로 진행했고,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이 그 모습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퍼포먼스(카페 공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완성하게 되었다. 아망토마을은 시작부터 지역사람들과의 이해와 교류를 통해 성장해 갔고, 준은 이러한 관계맺음 속에서 마을 노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이러한 형태로 영화관, 극장, 서점, 카페, 갤러리 등이 생겨나고 자기 손으로 가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유명해지면서 현재 100여 개의 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삼고 있다며 두 개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아망토마을이 하는 일’이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말했다.
랩39 김윤환 작가는 ‘문래동의 철제공장과 예술가의 동거’를 소개하였다. 문래동은 철제공장지역의 독특한 풍경, 저렴한 임대료와 넓은 공간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가촌이 형성되던 곳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여든 예술가들이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노력하던 중 서울시의 문래동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들은 머물던 공간을 떠나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한다.
|

대표 준 아망토
|
한받은 ‘두리반에서 맺은 문화연대와 회생’이란 주제로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강제이주의 위기에 놓은 두리반 식당을 지켜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홍대의 상업화와 라이브클럽의 침체 등으로 존립 장소가 줄어들고 있는 음악가들과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하게 되어 강제이주에 놓인 두리반 식당의 상황이 너무나 닮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낸 두리반의 경험을 통해 그는 예술가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창한 이름일 수 있는 ‘자립음악생산조합’을 계획해 앞으로의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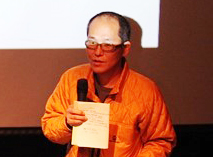 |
 |
|
작가 김윤환 |
음악가 한받 |
|
|
|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상상
아망토마을과 문래동, 두리반의 사례 그리고 이 사례들을 소개한 성미산마을은 ‘자립 공동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서있다는 의미의 자립(自立)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꿈꾸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한편, 요즘의 한국사회는 사회적기업을 비롯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만들기 등 지역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한시적, 한정적 지원으로 인해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기업 만들기 역시 진정성 있는 행정의 추진력과 정부재정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만 행정 지원을 받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많다. 이런 점에서 두리반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한받의 자립음악생산조합은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계획된 지원을 통해서가 아닌 예술가 스스로가 연대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제안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성미산마을과 아망토마을은 공동육아와 지속적인 예술가로서의 삶이라는 각기 다른 이유에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역과 진솔하게 관계를 맺고 모두를 위한 일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닮았다. 이는 두 마을이 현재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게끔 하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이번 포럼은 단편적인 사례 발표를 넘어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상상’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느끼게 하는 자리였다.
사진 _ 성미산마을극장 가림토 제공
|
|
|
|
|
 |
필자소개
박용휘는 남양주야외공연축제, 통과의례페스티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다문화축제 등에서 축제를 만드는 일과 사회적기업 티팟과 자바르떼에서 일하면서 지역과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일을 경험했다. 현재는 자립을 꿈꾸고 있기에 스스로를 자립기획자라고 소개한다. 페이스북 |
|
|
|
|
 박용휘 _ 자립기획자
박용휘 _ 자립기획자
 NO.153_2011.11.24
NO.153_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