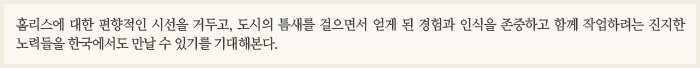|
|
최근 영국은 미술관을 중심으로 홈리스들의 경험과 재능을 도시의 새로운 예술적 가치로 환류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서는 미술관/박물관학 전문 학술지인 [뮤지움 프랙티스(Museum Practice)]에서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홈리스 아티스트에 대한 가능성을 재조명한 기사를 실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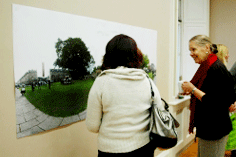
▲홀본 미술관에서 열린
홈리스 아티스트의 전시
(사진출처: Holborn Museum)
|
홈리스 아티스트
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주변에서는 관광객에게 돈을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홈리스를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다. 경찰에게 쫓기지 않고 벤치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공짜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관은 홈리스에게 몇 안 되는 도심 속 안락한 휴식처일 것이다. 영국의 국공립 미술관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하지만 큐레이터와 미술관 직원들은 이들의 사정이 딱하면서도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없어 홈리스를 쫓아내기 급급했다. 쉽게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미술관과 홈리스의 관계는 얼마 전부터 몇 몇 미술관의 홈리스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홈리스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미술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신진작가 플랫폼 프로젝트를 결합해 홈리스가 신진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영국 남쪽의 휴양 도시, 바스(Bath)에 있는 홀본 미술관(Holbourne Museum)은 홈리스 아티스트들과 함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미술관 정원사의 작업실에 홈리스와 예술가들이 만나서 한 시간 가량 진행하는 워크숍은 6년 사이에 홀본 미술관이 자랑하는 ‘홈리스 아티스트’를 배출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은 머그컵에 들어가는 그림부터 미술관 담벼락의 모자이크 벽화, 도시의 음악 축제 기간 동안 설치하는 조형물까지, 홈리스 아티스트가 만든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도시의 풍광을 바꾸고 있다.
런던에 있는 영국 국립 도서관(British Library)은 여덟 명의 홈리스 청소년들이 거주했던 거리와 사람들에 대해 묘사한 글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 기획 전시한 ‘라이팅 영국(Writing Britain: Wastelands to Wonderlands)’을 9월 25일까지 열고 있다. 거리를 떠돌면서 살았던 청소년들의 경험은 글과 사진이라는 매체를 만나서 예술적 재능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개인의 불우한 기억으로 남았을 일이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영국 국립 도서관은 전시 도록의 서문을 통해 젊은 홈리스 아티스트들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런던의 현재가 전시가 끝난 후에는 도서관의 기록으로 보관되고, 동시대와 후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영감을 불러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들, 셰익스피어, 디킨스, J K 롤링 등이 그 시대의 거리 풍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탁월했던 점을 떠올린다면, 이번 전시에 참여한 젊은 홈리스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미래에 영국 현대 문학의 명성을 이어간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

▲구룡의 왕 생전 모습
|
홍콩에는 ‘구룡의 왕(九龍皇帝, King of Kowloon)'으로 불리는 유명한 그라피티 예술가가 있다. 홍콩 구룡반도 전체가 그의 집이자, 먹을 품은 화선지였다. 창쩌우차이(曾?財, Tsang Thou Choi)는 보도블럭, 전신주, 신호등, 건물 외벽, 때때로, 주차된 차에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먹을 갈아 글씨를 썼다. 대대로 그의 선조가 통치한 구룡반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담화문이었다. 물론 구룡 왕국은 그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었다. 구룡의 왕은 경범죄로 유치장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다시 거리로 돌아와 붓을 쥐었다. 홈리스 아티스트가 그리는 캘리그래피(Calligraphy) 그라피티는 홍콩에서 익숙한 일상 속 풍경이 되었다. 그의 나이 서른 즈음에 시작한 거리에 쓰는 붓글씨는 홍콩 정부와 시민의 배려로 오십 년 넘게 계속되었고,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가 홍콩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아티스트로 그를 소개하기에 이른다. 비록 구룡의 왕은 현실에서 왕국의 재건을 못 보고, 눈을 감았지만, 그가 거리에 남긴 예술은 홍콩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논쟁이 점화되었고, 공공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거리에 남은 캘리그래피 유작은 홍콩의 디자인과 패션 산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도시를 주제로 리서치하고, 작업하는 예술가와 기획자를 자주 만난다. 하지만 도시의 구조물이나 역사에 대한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라, 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소통하면서 작업하는 시도는 드문 것 같다. 도시 빈민층에 대한 통계 수치로 대하는 홈리스에 대한 편향적인 시선을 거두고, 도시의 틈새를 걸으면서 얻게 된 경험과 인식을 존중하고 함께 작업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을 한국에서도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사 · 자료 원문보기
‘미술관과 홈리스: 서로에게 유익한 공존의 길을 찾아서’ (Museums and Homelessness: does creative outreach make a differenc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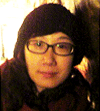 |
필자소개
문지문화원 사이 프로듀서. 인터-아트랩 등 현대예술 프로젝트 기획. 에라스무스 문더스 장학 프로그램으로 워릭대학교와 암스테르담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아시아의 현대공연예술, 이민/디아스포라 예술가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
|
|
|
|
 신민경_문지문화원 사이 프로듀서
신민경_문지문화원 사이 프로듀서
 NO.182_2012.09.13
NO.182_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