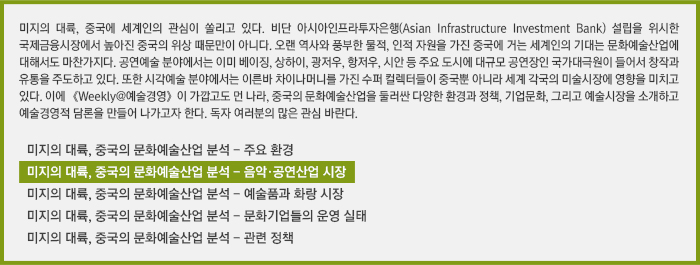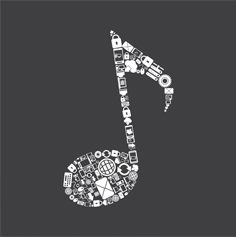 |
휴대폰 이용객은 통신사의 무선통신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 단말기에 접수되는 컬러링, 벨소리, Catch Call(回鈴), WAP, IVR, WWW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통신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한다. 중국의 3대 통신사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①China Mobile(中國移動), ②China Telecom(中國電信), ③China Unicom(中國聯通)이 있는데 이들이 관장하고 있는 SP와 CP가 1,200여 개사가 된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들 통신사들의 무선 음악 수입원은 대체적으로 컬러링 효능비, 뮤직클럽 회비, 음악 콘텐츠 정보비로 구분된다. 이들 통신사들은 각자 중앙음악플랫폼을 만들었는데 China Mobile은 미구(咪咕) 특급 회원제와 음악 수시듣기 4.0버전을 출시한 ‘뮤직Club’이 있고 China Telecom은 펑차오(蜂巢/꿀벌집)라는 ‘아이뮤직(愛音樂)’을, China Unicom은 창빠(唱吧), 인예타이(音悅台), 샤미망(蝦米罔) 등과 공동으로 출시한 ‘Wo(沃)뮤직’이 있다.
이들 3대 통신사들의 무선 음악시장 점유율은 China Mobile이 83%로 가장 크고 China Telecom 9%, China Unicom이 8%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1-2012년 중국디지털 출판산업보고’에 의하면 무선 음악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음악 사이트로 ①휴대폰QQ뮤직, ②쿠워(酷我), ③쿠거우(酷狗), ④두오미(多米), ⑤텐텐동팅(天天動聽), ⑥샤미(蝦米), ⑦카이신팅(開心聽) 등이 있는데 2012년도 1/4분기 중국의 무선 음악 이용객 분포에서 두오미(多米)가 55.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쿠거우(酷狗)가52.8%, 3위가 텐텐동팅(天天動聽), 4위는 휴대폰 QQ뮤직으로 이러한 추세가 2013년에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4. 가라오케(卡拉OK) 음악시장
중국에서 가라오케(卡拉OK)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6년 1월 29일 국무원령 제458호로 공포되었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락장소관리조례(娛樂場所管理條例)’에 따라 반드시 정부의 “오락장소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 수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가라오케(卡拉OK)가 약 10만여 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KTV, 노래방(歌聽), 나이트클럽(夜總會) 등과 최근 모바일 인터넷경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라오케를 통틀어 소위 가라오케(卡拉OK) 음악시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연간 이용객을 최소 14.6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쥬스다이(歡聚時代)라는 증시상장 문화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2012년도 가라오케(卡拉OK)류의 웹사이트인 YY의 영업 수입이 2.86억 위안에 이르고 다른 웹사이트 9158의 영업 수입은 무려 10억 위안에 다다른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밖의 웹사이트인 51Mike, 류젠팡(六間房), 구구(呱呱), 56 등도 대부분 억 위안(亿元) 이상의 영업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라오케(卡拉OK)류의 웹사이트에서만의 영업 수입이 2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는다.
5. 기타 관련 음악시장
중국은 아시다시피 960만 평방킬로미터라는 방대한 국토 면적과 13억 6782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이와 비례하여 전국에는 각급 방송국도 2,568좌나 있다. 이렇게 많은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음원 사용료(저작권 사용료)는 음악시장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
 |
중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의 녹음제품방송보수지급잠정조치(廣播電台電視台播放錄音制品支付報酬暫行辦法)”를 시행함에 따라 전국의 각급방송국들은 음악 방송 시 일정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일정한 사용료란 대체적으로 쌍방의 약정에 의하거나 광고비 수입 또는 음악 방송 시간에 따른 저작권료(사용료)를 산정하여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원, 상가(商街), 이발소, 가구점, 호텔, 헬스클럽, 은행 등 소위 공공장소에서의 배경음악도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배경음악이 음악시장에서 정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음악시장은 각 분야에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에 충실할 때 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앞서 언급했듯 음반시장에서는 해적판을 퇴치하고 디지털 음악시장에서는 온라인음악 미리듣기와 다운로드의 완전 유료화, 가라오케(卡拉OK) 음악시장과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의 음원 사용료 및 공공장소에서의 배경음악시장의 투명성 등이 확보될 때 중국의 음악시장 규모는 한마디로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정판(正版)과 해적판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디지털 음악 산업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문화부는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미발급자의 불법 뮤직 사이트를 폐쇄하고 ‘신문출판광전총국(新聞出版廣電總局)’은 해적판 음악 콘텐츠 서비스 기지를 몰수하며 ‘공업과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불법 해적판의 통신 서비스를 정지시키고 법원은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소송 진행 등으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해적판과 온라인 음악이 무료라는 오래된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건전한 음악 산업시장의 발전을 최종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1부 기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음악시장Ⅰ
참고링크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주요 환경Ⅰ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주요 환경 Ⅱ
|
 유재기_(사)한·중문화예술포럼 회장
유재기_(사)한·중문화예술포럼 회장
 NO.313_2015.07.09
NO.313_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