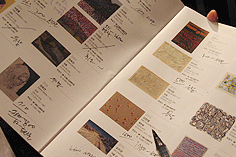 |
용인되지 못할 불공정 거래
현재 국내에서 개인 사이에 미술품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을 전혀 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거래 금액은 얼마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공평과세의 원칙, 거래의 투명성이란 원칙을 비켜나가 사실상의 불공평한 특권을 누렸던 곳이 국내 화랑가와 미술시장이었다. 지난해 서미갤러리가 연관된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미술품 세탁사건이나, 2008년 비자금으로 수백억 원대의 해외 고가 미술품을 구입해 큰 물의를 빚은 삼성가의 명품 스캔들도 모두 이런 틈새에서 일어나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재벌가 부자들의 편법 재산상속이나 국세청 간부들의 그림 로비 파문에서 보이듯 만만한 뇌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 1990년 정부가 처음 미술품양도세 과세안을 추진한 이래 ‘양도세 시행=미술시장 죽이기’라는 논리를 헌 칼 쓰듯 지리하게 반복하며 법안 시행을 저지해온 화랑업자들도 더 이상은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술시장의 활황기조에 정점을 찍었던 2008년, 작고작가의 6천만 원 이상 작품에 대한 매매차익의 20%에 세금을 물리는 정부 법안이 나왔으나, 2010년 12월 역시 화랑업자들의 로비로 국회가 시행을 2013년으로 다시 2년이나 늦춰주는 배려를 해준 마당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억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술판에서는 화랑업자들이 미술품양도소득세 폐지, 무관세 지대 신설 등 일부 유력 화랑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요구만 내놓으면서 미술품 내수시장 확대와 새 작가 발굴 등을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홍콩아트페어와 중국 미술계의 약진 등으로 국내 미술시장의 위기가 점증하고 있는데도, 장기적인 비전이나 구체적인 시장 활성화 대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분기마다 연례행사하듯 논리가 빤한 양도세 유예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민망하기만 하다.
현재 미술시장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침체나 거래 부진이 아니라, 뇌물이나 비자금 세탁의 대상으로 미술품을 선호해온 음습한 밀실 거래의 관행이 쌓여 낳은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숱한 논의 끝에 정리된 양도세 과세를 받아들여 투명한 거래 질서를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 거래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고액 미술품 매매의 내역을 모르고, 작품들의 소장 이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의 후진 관행부터 깨어야 한다. 직장인이 수십 년 힘겹게 번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형편에, 잘 사는 재벌가 큰 손들이 ‘입속의 혀’처럼 굽실거리는 화랑업주들을 끼고 사고파는 미술품에 세금 한 푼 떼지 않는 ‘불공정’을 국민들은 마냥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협회를 비롯한 화랑업자들은 이젠 진정으로 자기들 눈의 들보부터 봐야한다.
|
|
 |
필자소개
노형석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한겨레]와 [한겨레21]에서 오랫동안 미술과 문화재 분야를 취재했으며 현재 [한겨레] 대중문화팀장을 맡고 있다. nuge@hani.co.kr |
|
|
|
 노형석 _ [한겨레] 문화부 기자
노형석 _ [한겨레] 문화부 기자
 NO.166_2012.03.08
NO.166_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