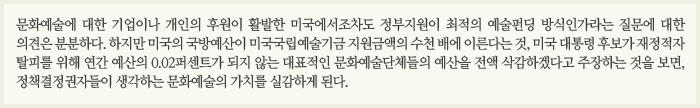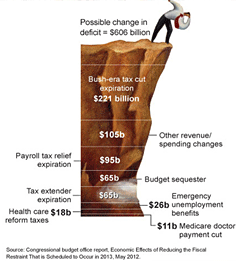
▲ 재정절벽 (Fiscal Cliff)은 세수증대와 지출삭감으로
약 6천6십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해소한다 (출처: 미 의회예산국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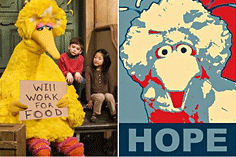
▲ 일자리를 찾는 빅버드(Big Bird)와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대선 포스터를
패러디한 빅버드 포스터 (출처: New York Times)
|
지난 11월초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후 미국 언론은 온통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미국은 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 현행 세금감면정책을 중단하고 정부지출을 삭감할 때 닥칠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경기부양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민주당과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이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세수확보방안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은 소위 말하는 재정절벽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한편, 정부지출삭감과 관련해서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지난 8월 [포춘(Fortune)]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후원단체인PBS 방송(Public Broadcasting Service), 미국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미국국립인문학재단(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10월 TV토론에서는 자신도 (PBS 방송의 세서미스트리트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빅버드(Big Bird)를 좋아하지만 빅버드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롬니 후보가 사실은 세서미스트리트보다 월스트리트를 더 좋아한다는 농담이 오갔다. 미국정부의 연간 예산은 약 3조8천 억 달러인데, 이 중 미국국립예술기금 지원금은 1억4천 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약 0.003퍼센트다. 롬니 후보가 언급한 3개 단체 지원액 총액은 미국 정부 예산의 0.02퍼센트가 넘지 않는다.
문화예술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원은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국립예술기금의 수장인 로코 랜스맨(Rocco Landesman)마저도 “비영리 예술단체의 숫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예술분야의 한정된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거나, “미국 내 5백7십만 예술인력 중 예술가는 2백만 명인데 예술가보다3배나 많은 숫자의 예술행정인력이 필요한가”라는 등의 언급을 하는 상황을 보면 일반시민들은 물론 예술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예술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지난 대선 전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는 ‘내 마음을 돌려봐(Change My Mind)’ 섹션에서 정부의 예술지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예술계 인사들이 독자들을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
|
지면에 나선 두 전문가는 댄서, 리서처, 투자은행가로 활동했고 현재 발레교사 및 예술블로거로 활동하는 칼라 에스코다(Carla Escoda)와 프렉쳐드 아틀라스(Fractured Atlas)의 리서치 디렉터인 이언 데이빗 머스(Ian David Moss)였다. 칼라 에스코다는 정부지원금이 가장 좋은 예술펀딩방법이라는 주장을, 이언 데이빗 머스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음에서 이들의 의견을 간추려본다.
|

▲ 미국국립예술기금(NEA) 의장
로코 랜스맨(Rocco Landesman)
(출처: New York Times)
|
예술지원은 예술정책에 그치지 않는 국가안보정책이다 – 칼라 에스코다
예술지원은 국가적인 주요 현안이어야 하며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 오바마 대통령이, 차세대 스티브 잡스가 미국이 아닌 싱가폴이나 한국에서 나올 것을 걱정하면서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새로운 제품이나 컨셉트를 디자인하는 것, 정해진 틀 밖에서 생각하는 데에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은 우리를 둘러보게 만들고 우리가 은유적으로 생각하게끔 한다. 또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며 새로운 것을 상상해 낼 수 있게끔 만든다. 예술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인다.
미국국립예술기금 예산은 1992년 1억7천6백만 달러를 기점으로 2012년 현재 1억4천6백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는 미국정부가 2030년대 말까지 총 2,456대를 구입하기로 한 F-35 스텔스 비행기 한 대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 금액은 또한 미국 국민 1인당 50센트 미만의 지원인 셈이다. 1인당 8~9달러 꼴로 예술에 투자하는 유럽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El Sistema)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50여 만 명의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음악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위기상태의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이 훈련에 전념 함으로써 높은 이상을 성취하도록 가르친다. 이것은 문화정책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이다. 미국은 2011년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만 79억 달러를 사용했다. 위기상태의 청소년 중 예술경험이 많은 이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학습능력과 대학 진학률은 물론 높은 시민의식이 관측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뉴욕씨어터발레(New York Theatre Ballet)의 리프트(LIFT) 프로그램은 이러한 위기에 성공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물론 정부의 예술지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민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예술지원, 대부분 자기만족 이상의 무엇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지원은, 다수의 수혜자가 아닌 지원주체의 편협한 열망과 우선순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뉴욕주 씨어터(New York State Theatre)가 데이빗 H 코치 씨어터(David H. Koch Theatre)로 명칭을 변경한 것처럼, 그리고 존 프라이(John Fry)가 해외의 발레 스타를 발레 산 호세(Ballet San Jose)에 초청해서 자기 여자친구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등의 예에서 보면 예술지원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기부자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민간지원은 정부지원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예술단체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개인과 기업의 정책에 기대어 프로그램이나 인력을 개발할 수 없다. F-35기를 한대만 덜 사도 미국국립예술기금의 연간예산을 두 배로 증액할 수 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랬었던 것처럼 국방예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미국의 공연예술단체 투어에 투입한다면 해외 주요국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문화부장관은 예술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말한다. 예술지원은 예술정책에 그치지 않는 국가안보정책이다.
재정위기의 유럽이 미국식 예술지원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 이언 데이빗 머스
나는 미국국립예술기금과 정부의 예술지원이 지역 및 계층간 경계를 넘어 미국인들에게 예술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허핑턴포스트]가 묻는 질문은 ‘정부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아니라 ‘정부지원금이 가장 좋은 예술펀딩 방법이냐’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지지단체인 미국예술연합(AFA: Americans for the Arts)은 미국국립예술기금의 올해 예산으로 1억5천5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국립예술기금의 예산이 이것의 열 배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비영리 예술단체의 연간 예산인 6백3십억 달러의 4분의 1밖에 충당하지 못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예술지원금, 연방정부와 주정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 지출액의 약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하는 민간재원의 지원금이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독일정부의 예술지원금은 독일국민 1일당 약 20달러 정도다. 국민1일당 41센트를 예술지원에 할애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민간 지원부분을 살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독일 예술단체에 투입되는 민간 지원액은 연간 2억5천만 달러로 미국의 민간 지원액 133억 달러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유럽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유럽의 많은 정부들이 미국식 지원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정부들이 예술지원액을 삭감하면서 정부지원에만 의존했던 많은 예술단체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나마 유럽과 미국식 지원모델을 복합적으로 수용했던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예술단체 지원예산을 15% 삭감했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의 약 30% 이상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2010년 연방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을 때 사라예보의 국립박물관 직원들은 7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국가들의 예술단체들과 비교한다면 예산의 대부분을 민간지원으로 충당하는 미국의 예술단체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지원과 함께 자율성을 보장해 온 서부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이나 러시아는 예술을 검열의 대상이자 국가주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유럽식 정부예술지원은 좋은 모델이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유럽이 점점 더 미국식 예술지원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
 심재욱_펜실베니아주립대 MBA 과정
심재욱_펜실베니아주립대 MBA 과정
 NO.194_2012.12.13
NO.194_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