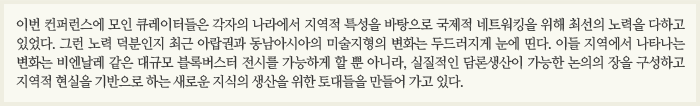|
|
급변하는 동시대 예술과 함께 예술을 매개하거나 전시를 만들어 내는 큐레이터의 역할도 점차 복잡다단해 지고 있다. 특히, 미술계의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리즘의 문제는 동시대 예술을 다루는 큐레이터들에게는 해결이 요원한 난제로 다가온다. 지난 5일 대림미술관에서 벌어진 한국미술 글로컬리즘 컨퍼런스 <Curating in Asia>는 젊은 큐레이터들과 국내외 시니어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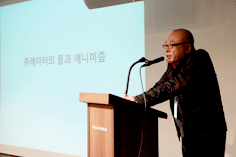
▲ 이영철 아시아 문화개발원 원장
1) 더아트로(theArtro) 기사 ‘[이슈] 우주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라’ 중
|
총체적 삶의 기획에 대한 고민 필요
올해 첫 눈이 내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은 시간에 진행된 이영철 아시아 문화개발원 원장의 기조발제는 ‘큐레이터의 몸과 애니미즘’이란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이 발제에서 그는 “아시아를 대륙으로 언급하는 것은 유럽 대륙의 자기 언급과 얽혀 있는데, 15세기 이후 자본주의적 영토 제국주의와 더불어 발생했다”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 avorty Spivak)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럽이 존재하는 이상 아시아가 항상 타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큐레이터는 아시아적인 지식 생산 방식의 모델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이 질문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원장의 생각은 아시아적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백남준의 활동으로부터 받은 영감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또한 “백남준이야말로 유럽문명을 새로운 지점에서 재구성하는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작가”1) 라고 말하면서 백남준의 기획은 단순한 예술작품의 생산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명사적 전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에 요즈음 젊은 큐레이터들이 자신의 몸으로 수행해 나가는 총체적 삶의 기획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고 비판했다.
|
|
|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해외 큐레이터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호주의 디지털 댄스 페스티벌 디렉터인 알레시오 카발라로(Alessio Cavallaro)는 올해 릴 댄스(ReelDance)의 디렉터로서 <Dance on Screen 2012>를 기획하였다. ACMI(Australian Center for the Moving Image)의 책임 큐레이터로도 활동한 바 있는 알레시오는 다수의 스크리닝 프로그램과 사운드 아트 전시 및 호주 미디어 아트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Carnival of e-Creativity의 디렉터인 샹카 바루아(Shankar Barua)는 어드벤처-여행 작가이자, 사진가, 삽화가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문화 상황 안에서 사회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기획을 해오고 있다. 그는 인도의 전통 음악이 멀티미디어와 영상 언어 그리고 퍼포먼스와 결합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의 힘을 만들어 내는 기획을 가능하게 했다. 카이로 출신으로 브뤼셀에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타렉 아부 엘 펙투(Tarek Abou El Fetouh)는 자신이 설립 당시부터 참여하고 있는 미팅포인트 페스티벌(Meeting Point Festival)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아랍권의 시각예술, 영화, 연극, 무용, 음악과 퍼포먼스를 소개하는 행사로 ‘Young Arab Theater Fund’가 여섯 번째로 기획하였다. 5회는 프리라이젠(Frie Leysen), 6회는 오쿠이 엔워저(Okwui Enwezor)와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7회에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콜렉티브(WHW)가 기획을 맡을 예정이다. 이 페스티벌은 아랍권의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 넣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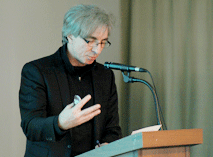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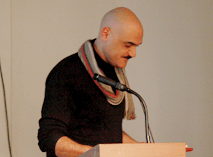 |
|
▲ 알레시오 카발라로(Alessio Cavallaro) |
▲ 타렉 아부 엘 펙투(Tarek Abou El Fetouh) |
또한, 싱가포르미술관(SAM)의 탄 분 후이(Tan Boon Hui) 디렉터는 2011년 싱가포르 비엔날레에 대해 소개하면서 어떻게 남아시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설립 당시 싱가포르 내의 종교,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 국한 되었던 이 비엔날레는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공공 컬렉션을 기획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SAM의 전시 및 행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비엔날레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어떻게 서구 미술관의 중요한 가치들을 아시아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관심을 극대화하고 자국 내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모리미술관의 나츠미 아라키(Natsumi Araki) 큐레이터는 롯본기에 있는 모리빌딩의 공간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들에 대해서 소개했다. 특히, 한국, 태국,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의 작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MAM 프로젝트는 최근까지 총 18명에 이른다.
현대미술의 이슈별로 나뉘어진 그룹 토론에서는 글로컬리즘, 공동 펀드레이징, 프로모션, 네트워킹, 온라인 아카이브, 소셜아트, 퍼포밍 등 다양한 이슈들을 참여 큐레이터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알레시오 카발라로(Alessio Cavallaro)와 인도의 독립큐레이터인 상카 바루아(Shankar Barua)의 그룹 토론에 함께 참여했다. 함께 참여한 한국 큐레이터들은 미술관과 같은 제도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립적인 기획자로서의 큐레이터를 요구하는 동시대 예술의 현장과 조직 문화와의 충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미술관이 관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나 경험이 없는 큐레이터들의 경우 독립적인 기획보다는 시니어 큐레이터를 돕는 역할에 한정될 경우가 많다보니 큐레이터로서의 기획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 그룹토론 장면
|
실행 가능한 행동에 대한 경험 공유
그룹 간의 토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탄 분 후이와 함께 했던 그룹에서는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열며, 정체성과 로컬리티, 그리고 그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시아의 젊은 예술가와 큐레이터 대부분이 서구식 교육 체계에서 성장하며 서구의 문화와 방식을 체화하며 자라온 현실로 볼 때, “의식적으로 아시아의 로컬리티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개인적 영감에 기반한 자발적인 로컬리티의 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인상적이었다.
모리 미술관의 나츠미 아라키가 참여한 그룹의 토론에서는 관객에 대한 예술의 역할과 방법론을 제안해보는 자리였다. 예를 들어 영토분쟁과 같이 민감한 사안들을 예술로 표현할 때 관객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큐레토리얼의 태도와 방식에 관한 의견은 무엇인지, 관객과 예술 양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형태의 전시는 무엇인지에 관한 모색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또, 나츠미 아라키의 프레젠테이션에 소개된 한·일 작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아시안 아티스트들의 예술 언어와 방식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오갔다.
마지막으로 타렉 아부 엘 펙투와 이영철 원장이 함께했던 그룹은 미팅포인트 페스티벌,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같이 아시아를 기반으로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큐레토리얼 실험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글로컬리즘’ 전반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히 타렉의 미팅포인트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지역적 상황과 조건들, 이른바 ‘아랍월드’라고 부르는 모호한 경계에서의 큐레이터쉽과 실행 가능한 행동들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변방인 아시아에서 유효한 이슈와 큐레이터쉽의 지점들에 대한 공감을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모인 큐레이터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최근 아랍권과 동남아시아의 미술지형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눈에 띤다.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비엔날레 같은 대규모 블록버스터 전시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담론생산이 가능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지역적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위한 토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Curating in Asia> 컨퍼런스가 아시아 지역의 큐레이터들이 만나 정보를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로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
|
|
|
 |
필자소개
백기영은 1969년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미디어 예술을 전공하였다. 2006년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 디렉터를 걸쳐, 2007년 안산 원곡동에서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디렉터를 역임하였고, 2009년 경기창작센터 개관 시 부터 학예 팀장으로 일하다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을 맡고 있다. 페이스북 |
|
|
|
|
 백기영_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백기영_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NO.195_2012.12.20
NO.195_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