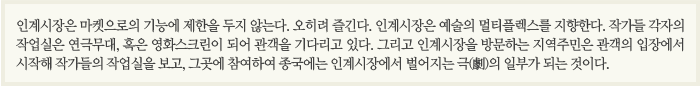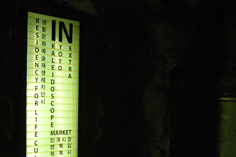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보이는 간판,
건물 바깥에서는 볼 수 없다.
|
인계시장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갈 곳은 수원역이다. 그곳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고,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삭막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나혜석거리로 향한다. 구한말, 최초의 여류 화가이자 시인이며,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이었던 나혜석의 이름을 딴 길이다. 하지만 수원에서 그곳은 유흥가와 오피스텔 거리로 더 유명하다. 택시에서 내리자 바로 나혜석거리다. 떠들썩한 폭우가 서울을 강타한 다음날이지만 거리는 평화로워보인다. 물이라면 지긋지긋한 며칠을 보내고 온 손님을 환영하듯, 분수가 물을 뿜어대고,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뛰어다닌다. 나혜석 동상을 지나쳐 분수대를 따라 걷다보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 4층과 5층에, 인계시장이 있다.
수원이라는 도시, 구한말의 신여성, 밤을 기다리는 유흥가의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들 사이에 인계시장은 자리하고 있었다. 커피를 파는 1층을 지나 바와 노래방을 건너뛰고 당도한 4층은 작가들의 작업실이 갤러리를 겸하여 옹기종기 모여 있다. 5층은 작가들이 숙식하는 공간이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 인계시장의 얼굴이 곧바로 보인다. 숨길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예술가들의 눈, 코, 입은 선량하다.
|
|
|
도시와 예술가의 만남, 그것이 재생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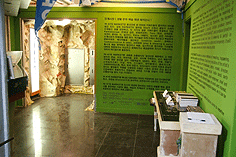

인계시장 모습
|
인계시장은 작업과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곳이다. 또한 전시와 참여가 구분 없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사라진다. 방문객은 손님이 되기도 하고, 인계시장이라는 무대의 출연진이 되기도 한다. 작가들은 각자 작업을 한다. 참말, 이상한 공간이다.
그런 이상한 공간에서 총 10명(팀)의 작가가 작업 중이다. 각자의 작업실 이름도 특이하기 그지없다. ‘나머지 연구소’ ‘유리손톱’ ‘죽도밥도 스튜디오’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5층은 말했다시피 작가들이 자고 씻는 방이 있다. 원래 그곳은 원천적인 의미에서 ‘자고 씻던’ 곳이었다. 이곳의 작가들은 욕망이 재생되던 공간에서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의 물리적 재생, 상징적 재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이다.
이곳은 원래 안마시술소였다. 인계시장 레지던시는 그곳에 자리 잡았다. 그런 이유로 예술가들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그곳은 성이 소비되는 곳에서 예술이 생산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인계시장을 소개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주는 퇴폐성에 방점을 찍었지만, 김월식 디렉터의 생각은 달랐다. 언론은 자극적인 카피로 뉴스를 팔았을 뿐이라고, 이곳이 안마시술소인 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안마방이나, 노래방이나, 혹은 기원이나, 입시학원이나 모두 삶의 이야기나 에너지가 사고 팔리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을 인계시장이 열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공간이든 그곳은 삶의 행위가 벌어지던 곳이다. 그곳이 예술을 만나 재생되는 도시의 모습, 그로 인해 재생되는 예술가의 모습, 그들이 만나서 엉키고 풀리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인계시장의 무늬만 커뮤니티는 어두운 빌딩의 4층과 5층에서부터 도시를 재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늬만커뮤니티?
무늬만커뮤니티의 진짜 소통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인계시장이라는 이상한 공간의 설계자, 김월식 디렉터는 말한다. “‘예술’과 ‘예술-아님’의 경계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이곳의 예술이다.” 그건 생활과 예술의 중간지대이기도 하면서, 작가와 대중의 공동 작업실이기도 할 것이다. 마음껏 차이나는 것들이 최대한 서로에게 무심하면서 동시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일. 그 관계 맺음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이 인계시장의 근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안양에서 있었던 공공예술프로젝트 ‘무늬만커뮤니티’가 인계시장에 접목된 것이다. 지역과 작가와 일반인이 만나는 커뮤니티가 인계시장이라는 장소를 만나 걷잡을 수 없이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이 무늬만커뮤니티의 전략이라면 전략이겠다. 다른 말로 전략이 없는 셈이기도 하다.
전략이 없기에 그곳의 작가들은 무척이나 자유로워 보인다. 무더위 속에서 인계시장을 취재하며 다큐멘터리를 찍은 방송국 사람들과는 며칠 된 인연인데도 몇 년 지낸 친구처럼 스스럼없어 보인다. 불편한 참관자가 될 법하기도 한 경기문화재단 사람들은 어느새 친한 동료가 되어 밤마다 맥주로 함께 목을 축인다고 한다. 네팔에서 온 청년작가인 수잔 당골(Sujan Dangol)과 상게 세르파(Sange Sherpa)는 건강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한국의 괴이한 여름 날씨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들은 시원한 냉커피를 나눠 마시며 각자의 작업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곤 한다.
|

인계시장 카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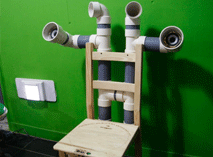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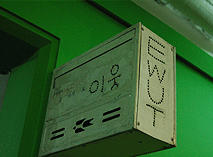 |
|
고창선 작가의 (쩍벌남을 위한 소리의자) |
(예비)사회적기업 ‘이웃’의 간판 |
언론에 노출되면서 지역민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인계시장은 마켓으로의 기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즐긴다. 인계시장은 예술의 멀티플렉스를 지향한다. 작가들 각자의 작업실은 연극무대, 혹은 영화스크린이 되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인계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관객의 입장에서 시작해 작가들의 작업실을 보고, 그곳에 참여하여 종국에는 인계시장에서 벌어지는 극(劇)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벼룩시장을 통해서,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전시를 통해서 그것은 가능해진다.
실제 인계시장의 입주작가 중에는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작가도 있다. ‘이웃’(EWUT)이라 불리는 이들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놀이 생협’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소셜 디자이너를 꿈꾸는 두 청년이 이끄는 모임이기도 하다. 그들의 건투가 수원의 진짜 미래가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든다.
차이에 주목, 다름에 올인하다
도심의 어느 빌딩에서 무한히 확장되고 재생되는 인계시장의 알고리즘algorithm,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 내는 규칙의 집합은 작가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특성과 그곳을 찾는 일반인, 작가의 상상력, 바깥의 소음까지도 모두 알고리즘의 논리가 된다. 그리고 답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계시장에 모인 작가들은 특정한 공통점이 없어보였다. 그들에게 두드러진 것은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성이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지향하는 그들에게 차이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재료로 보인다.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과정, 그리고 다른 결과물을 통해서 인계시장은 구성되어 있다. 그런 다름의 구성은 본래의 것과 다른 또 다른 결과물을 이끄는 재료가 될 것이다. 재활용품을 재료로 하는 그들의 작업은 결국, 자기 자신과 지역의 공간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

김월식 디렉터
|
 |
 |
|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인계시장 프로젝트의 벼룩시장 |
무늬만프로젝트의 기간은 9월이면 마무리된다. 6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는 한여름의 햇살처럼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의 인계시장은 그 가능성이 무한해 보인다. 6개월이나 1년 후가 더욱 기대된다. 인계시장이라는 플랫폼에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틈입하고 재생시킬 나혜석거리의 모습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인계시장을 빠져나와 다시 나혜석거리 중앙의 분수대 앞에 선다. 벤치에 앉아 잠깐 주변을 둘러본다. 그곳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다행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도시의 재생이 진짜 재생임을 인계시장의 작가들은 잘 아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선량한 눈에서 발현되는 시선이 수원의 어느 유흥가를 두르고 있다. 그들은 끝까지 갈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기에, 지금이 중요하고, 그들의 지금은 다음의 지금을 기대하게 한다.
사진제공 인계시장 프로젝트
|
|
 |
필자소개
서효인은 시인이다. 시집으로 『소년 파르티잔 행동 지침』이 있다. 시를 더 많은 사람이 읽어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머리는 아프겠지만 결국 행복해지겠지, 라는 헛된 망상도 한다. seohyoin@gmail.com |
|
|
|
|
 서효인 _ 시인
서효인 _ 시인
 NO.138_2011.08.04
NO.138_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