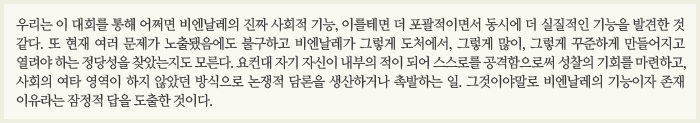|
|
1995년 광주에서 국내 최초의 ‘비엔날레’가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비엔날레들이 여러 지역에서 다종다양하게 개최되면서 우리는 이제 굳이 그 용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가 되었다. 즉 비엔날레하면 곧 ‘대규모 국제 현대미술작품 전시’를 서로 떠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비엔날레에는 작품과 전시만이 아니라 담론과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 비엔날레는 동시대 삶과 문화의 중요한 이슈를 예술을 통해 제시하고, 그것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중 일반이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사고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하기 위한 특별한 장(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전시 중심 비엔날레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학술대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왔던 관행을 넘어, 비엔날레를 둘러싼 쟁점의 생산 및 담론 차원의 교류를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이 창설된 것은 아주 당연하고 반길 일이다. 그 플랫폼의 이름은 ‘세계 비엔날레 포럼(World Biennial Forum)’이다.
|


▲▲ 왕후이 칭화대학 인문학 교수
▲ 샹탈 무프 웨스트민스터대학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사진: 광주비엔날레 제공)
|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비엔날레에 걸려있는 논점들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는 광주비엔날레재단, 네덜란드에 근거를 둔 비엔날레재단(Biennial Foundation), 독일 IFA(The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비엔날레를 기획, 조직, 운영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및 활동가’가 참여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서로의 지식과 경험과 문제의식을 나눈 자리였다. 대회의 전체 기획을 담당한 영국 왕립 예술대학 학장이자 큐레이터인 우테 메타 바우어(Ute Meta Bauer)와 큐레이터 후 한루(Hou Hanru)는 ‘중심의 이동(Shifting of Gravity)’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포럼 주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의 비엔날레에 걸려있는 논점들을 짚어나갔다.
그 논점들이란 민주주의의 위기,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위한 미학, 세계주의의 이면 등 이론적 숙고를 요하는 것에서부터 더 이상 큐레이터와 작가/작품이 이동하지 않고 여러 도시를 유랑하는 새로운 비엔날레 유형 같은 경험적 사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또 현대미술계에서 그간 실행된 각종 비엔날레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비엔날레가 존재할 명분을 따지는 급진적 질문이나 지금 여기서 그 예술제도가 노정하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비판까지 다층적인 양상을 띠었다.
여기서 국내 문화예술 현장 방문 일정을 제외하고 실제 포럼이 이뤄진 삼일 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들여다보자. 중국 칭화대학 인문학 석좌교수 왕후이(Wang Hui), 호주 멜버른대학 문화커뮤니케이션 교수 니코스 파파스테르기아디스(Nikos Papastergiadis),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대학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인 정치 이론가 샹탈 무프(Chantal Mouffe)가 포럼을 위한 ‘기조발제’를 했다. 이 중 앞의 두 이론가가 하루에 하나의 발표로 광주에서의 이틀간 포럼 문을 열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실행 중인 수많은 비엔날레 중 23개 사례들이 여섯 개의 ‘사례연구’ 섹션을 통해 소개돼 토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무프의 발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


▲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 현장 모습
(사진: 광주비엔날레 제공)
|
비엔날레 : 미술의 현장, 미술의 실행, 미술의 진행형
기조발제와 사례연구. 이 같은 구성은 일견 대부분의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가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 포럼’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할 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적잖다. 동시대 미술의 유력하고 우세한 형식으로서 비엔날레가 가진 두 가지 성격이 그 포럼 구성 방식에 녹아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첫째, 비엔날레는 무엇보다 미술의 현장이고, 미술의 실행이며, 미술의 진행형이다.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비엔날레의 역사는 1895년 창설된 베니스비엔날레부터 따지면 100년 넘게, 이스탄불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베를린비엔날레 등 당대적인 의미의 비엔날레 출현을 계기로 따지면 약 25년 이상이다. 그런데 그 역사적 시간 동안 비엔날레가 가장 중시해왔고 담보하려 매진한 것은 실험성이다. 과거의 미술이 되지 않기 위해, 미술가의 진보적인 상상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급진전하는 사회와 연동하기 위해 비엔날레는 항상 현장을 만들었으며, 미술로 승인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실험적인 미술로 제시해 왔다. 그러니 당연히 비엔날레는 언제나 이미 어떤 보편적 정의나 일반적 범주를 탈주하는 예술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 비엔날레 포럼은 그런 비엔날레 속성을 ‘사례연구’라는 형식 속에 적합하게 담아냈다.
그런데 둘째, 위와 같은 비엔날레의 성격은 비엔날레가 단지 미술작품들을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전시해 감상자가 심미적 경험을 하도록 돕는 역할에 만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엔날레는 또한 철학과 미학의 논제를 생산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제를 선점하며 담론의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비엔날레 포럼이 세 이론가의 논설을 주춧돌 삼은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이다.
여러 이질적인 비엔날레 사례들과 기조발제 가운데서 포럼 참여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논의의 긴장감을 높였던 것은 흥미롭게도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비엔날레(Sharjah Biennial, UAE)·러시아의 우랄인더스트리얼 현대미술비엔날레(Ural Industrial Biennial of Contemporary Art, Russia)·아랍권역이 연대한 미팅포인트(Meeting Points, Arab World)가 사례 발표한 섹션이었다. 상대적으로 신생이거나 젊은 비엔날레에 속하는 이 비엔날레들의 활동은 세계 비엔날레 포럼 동안 핵심으로 떠오른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비엔날레의 역할’에 대해 참여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계기를 제공했다.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의 허가도 없이, 예산도 없이, 일정한 개최 도시도 없이 게릴라식으로 비엔날레를 만들어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새삼 ‘우리는 역사적인 것이 되길 원치 않으며, 항상 담론의 폭발 장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
|
|
필자는 그 과정에서 올해 카셀도큐멘타를 예로 들며 비엔날레가 지난 십여 년간 사회적이고 정치 실천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그러한 미술을 선호해왔지만, 이제는 현대미술의 우세한 제도로서 스스로 파워 게임에 빠지고 매너리즘 상태를 노출한다고 비판적으로 논평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월간)[아트 인 컬처] 2012년 11월호를 보기 바란다). 또 다른 질문자는 미술시장과 비엔날레의 유착에 대해 말했다. 위의 사례 발표와 이 논평이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 포럼은 많은 시간 비엔날레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재고(再考)하는 자리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이 포럼을 통해 어쩌면 비엔날레의 진짜 사회적 기능, 이를테면 더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더 실질적인 기능을 발견한 것 같다. 또 현재 여러 문제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가 그렇게 도처에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열려야 하는 정당성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자기 자신이 내부의 적이 되어 스스로를 공격함으로써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의 여타 영역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논쟁적 담론을 생산하거나 촉발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비엔날레의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는 잠정적 답을 도출한 것이다. 제1회 세계비엔날레 포럼은 그 점에서 제 할 일을 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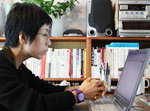 |
필자소개
강수미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미학자이며 미술비평가이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발터 벤야민의 미학에 관한 연구, 현대미술과 비평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 그와 관련한 국책·민간·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미학』, 『한국미술의 원 |
더풀 리얼리티』, 『서울생활의 재발견』등이 있다.
blog: desumi.egloos.com
|
|
|
|
|
 강수미 _ 미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술연구교수
강수미 _ 미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술연구교수
 NO.189_2012.11.08
NO.189_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