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밀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 하나인 밀양아리랑의 고장이다. 노랫가락이나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예부터 경상도라고 하면 억양강한 구수한 사투리와 투박함이 장점이자 강점이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시내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우리나라 3대 누각중 하나인 영남루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는 사명대사의 영험이 서려있는 표충비각, 표충사, 그리고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 등등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밀양은 북쪽이 문화유적지가 산재한 산악지형이고 낙동강 줄기와 맞닿은 남부지방은 비옥한 평야지로 1970년대 이전에는 인구 20만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여느 농촌마을과 같이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11만 정도의 소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소도시화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의 혼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밀양을 알리기 위해 크고 작은 문화예술 활동에 열심이다.
대표적으로는 53회째 이어지고 있는 종합예술축제인 밀양아리랑 대축제, 1999년 10월,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 밀양연극촌이 입촌하면서 시작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특히 지금 밀양연극촌은 성곽모형의 새로운 야외극장으로 꾸며져 성곽을 배경으로 열돌맞이 축제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예술가,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고장’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입에 달고 살지만 일반인들은 예술가들을 이해하기도, 다가가기도 정말 어렵다고 느낀다. 예술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실상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직접 참여하기 쑥스러워할 뿐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어느 지역인사가 행사 인사말에서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예술이야말로 좋아서 빠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3년 넘게 이 일을 맡아하면서 동료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예술가는 예술가로 인정해 줘야만 서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예술 하는 사람을 우리처럼 행정업무 보는 사람으로 생각지 말라.”는 말이다.
문화예술 현장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문화예술인들도 다 같은 사람인데, 일부에서는 그들은 공기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착각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예산 지원에 인색하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희망한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문화생활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는데 문화예술은 행정적으로 풀어나가기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 그렇기에 정책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예술인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해 겉돌기만 했던 처음과는 달리 나 역시 지금은 공연이나 전시회 후 뒤풀이에도 꼭 참석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협력자로써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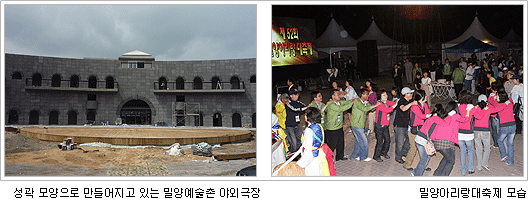
지역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지역의 특성은 제각각이다. 한 곳도 같은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을 잘 살려서 강점을 부각시키는 차별화된 문화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의 원천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바탕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gif)  |
|
필자소개
박옥희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밀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무원 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2003년 밀양시 문화관광과에 발령받아 문화재 담당, 관광담당, 현재는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