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8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는 낯선 세 사람을 공연장 무대에 올려놓고 미술관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전시 《천수마트 2층》(큐레이터 현시원)과 전시설명회가 열렸다. 한 시간짜리 퍼포먼스와 같은 전시에 마치 연극 주인공처럼 무대에 오른 세 사람은, 종로구 소격동 144-17번지 천수마트 2층에서 작업을 해오고 있는, 79년 개인전 이후 전시를 해본 경험이 없는 미술작가 조성린, 늘 남을 위해 필요한 가구와 사물을 디자인· 제작해온 작가 박길종, 그리고 작품해설사인 나, 황호경이었다.
나로서는 극장에서의 전시해설이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여겨졌다. 나는 뒤늦게 미술을 공부하고, 2006년부터 미술관에서 작품해설사로 일해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미술관 밖에서 작품해설을 해 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무대’에서라니. 이 모든 불편함의 시작은 큐레이터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내 탓이었다. “자신 없다” 거절해 놓고 결국 “‘낯선’ 작가들의 전시가 선생님의 해설과 만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서운 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실 매번 전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만나고 공부가 시작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한 가지 있었다. 늘 내가 있는 공간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그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 품을 떠나야 하는 아이처럼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서 느낀 호기심과 재미가 쏠쏠했다. 내가 미술관에서 설명하는 작가와 작품은 세계적, 세기적, 국제적이다.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뿐만 아니라 피카소, 샤갈, 모네 등등 미술사에 등장하는 특급 주인공들을 다 만났다. 요즘은 앤디워홀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를 만났고, 그들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이번 극장 전시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작가의 작품해설을 맡게 됐다. 하지만 이게 웬일? 작가와 작품에 대한 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즐거웠다. 한국의 미술사 안에서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작가들에 대한 공부가 새롭고 흥미로웠다. 특히나 여든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은, 더욱이 그랬다.
|

‘고래, 시간의 잠수자’(주최 국립극단) 중
《천수마트 2층》전시해설 모습
촬영 오석근
|
작품이 전시된 깜깜한 무대, 너무나 조용한 객석, 무대 중앙에 놓인 나, 그 위로 쏟아지는 한 줄기 조명빛. 마이크는 켜지고 ‘그날’의 작품설명은 한 편의 모노드라마처럼 시작됐다. 어떻게 끝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기억나는 한 마디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경험이었다”고 했던 끝인사. 그리고 시험을 마친 기분도 잠시, 이제는 답안지를 맞춰 보기 시작했다. 흠…, 나름 나쁘지 않은 듯 했다. 아니 뜻밖에도 후한 점수를 주시는 관객이 많았다. 전시장 밖에서 듣는 전시 설명도 좋다, 연극 무대에서 만나니 참 신선하다, 미술관에서보다 더 작품에 빠져 들었다 등등. 아쉬운 점도 많았을 텐데 나를 앞에 두고 하는 말씀들이라 그런지 꽤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전시해설사를 가장 떨게 하는 상황은 바로 전시 첫 날, 첫 설명.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들 첫 설명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전시설명은 기획자와 작가를 앞에 두고 하는 설명이다. 나는 그날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 그것도 아주 낯선 곳에서. 그런데 관객의 반응은 그 어떤 전시 때보다 뜨거웠다. 갑자기 아쉬워지기 시작했다. 후회도 밀려 왔다. ‘이렇게 좋아해주실 줄 알았더라면 괜히 떨었다!’. 하루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다. 거짓말처럼 그날은 사고의 연속이었다. 칼에 베이고, 출근길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다시 집에 뛰어가고, 결국 지각하고, 엘리베이터 층수 잘못 누르고, 밥값 계산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내밀고…. 긴장에 의한 코미디의 연속이었다. 대체 왜 그랬던 거야, 바보처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면서 늘 ‘국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눌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해설도 마치 준비된 방송용 멘트처럼 딱딱하기 일쑤다. 하지만 그날은 모처럼 ‘자유롭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큐레이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도 했지만 무게감을 벗어던진 경쾌함을 설명 내내 스스로 맘껏 즐길 수 있었다. 박길종 작가의 주문대로 ‘도도하고 우아하게’ 전시장치를 다루며 무대 이곳저곳을 누볐다. 국립미술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선 이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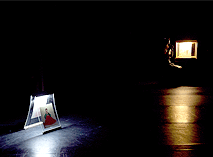 |
 |
소극장 판에 전시된 작품들
촬영 오석근 |
전시해설 후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 |
이제는 많은 것들이 또렷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는다. 조용한 객석, 내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관객의 진지한 표정, 순간순간 살갑게 반응하며 보여 준 아낌없는 리액션, 웃음소리, 박수소리…. 그날은 까만 객석만이 머리에 가득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선명해진다. 그리고 지금 난 그날의 ‘두려움’을 몽땅 ‘설렘’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시는 미술관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설명이었다”는 끝인사를 건넸는데, 어찌 주워 담아야 할지 참 고민이다.
사진제공 _ 국립극단
|
|
 |
필자소개
황호경은 대학에서 어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잡지사 (주)여원에서 출판부와 편집부 기자로 일했다. 결혼 후 오래도록 전업주부로 있다가 뒤늦게 대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인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작품해설사로 일하고 있다. 100hhk@hanmail.net |
|
|
|
 황호경 _ 덕수궁미술관 작품해설사
황호경 _ 덕수궁미술관 작품해설사
 NO.143_2011.09.08
NO.143_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