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날 대학로 술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A, B, C 세 명이었다.
삼십 대 중반에서 후반의 비슷한 연배,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계에서 기획, 지원, 운영,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은 업무상 혹은 문화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에 비하여 사실 그리 자주 술자리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미리 예정된 자리는 아니었지만, 약속이라도 하고 만난 듯 그들의 대화는 끊임이 없다.
A가 말했다.
“ㄱ씨가 S 기관의 대표로 가셨더라구요.”
약 10여 년 전 그들이 막 문화예술계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팀장, 혹은 부장으로 모셨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큰 단체나 기관의 수장이 되어있다. 이 세 사람이 거의 모든 예술관련 기관의 대표들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꽤 묘한 기분이 들게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현실에 대한 확신은 그들을 더욱더 묘한 지경에 빠트렸다. ㄱ을 포함한 그 세대는 문화예술 분야를 단순히 직업으로 선택했거나, 자신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아니면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관련학문을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세대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 산물을 보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A, B, C 세대와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있다.
한 번도 어딘가의 대표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이 살아왔던 그들은 문득,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을 넘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예술가가 아닌 그들에게 문화예술계 안에서의 미래는 거대기업 내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로 일단락되었다.
B가 말했다.
“지난 달에 둘째가 생겼어요.”
B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A도 속으로 뜨끔하다. 좀 전까지 대기업의 일개 직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성토한 그들이지만, 실은 10년 이상의 문화예술계 생활이 금전 외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되었다. 예술가들과 빈번하게 교류하며 그들과 비슷한 생리를 습득하고, 자주 해외를 드나들며, 각종 언론과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문화컨텐츠를 직접 만들어가는 동안 분명 그들의 삶은 낮은 가운데서도 빛났다. 하지만, 지난 시절 좀 더 자유롭(게 보이)고, 좀 더 창조적(으로 보)인 그들을 부러워하는 보통 친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신 우리는 빈털털이”라고 말하는 호기는 한 번도 부리지 못했다.
그나마 비교적 대우가 좋은 곳에 다니는 C에게 질문이 이어졌는데, C가 이내 “자기의 직장에는 이미 예술적인 꿈과 희망이 없다”고 자학하는 통에 분위기는 더욱더 침울해졌다.
C가 말했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저희 때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C가 다니는 직장의 신규공채에 젊은 인재들이 너도나도 모여들어 경쟁률만 해도 수십 대 일이었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해외유학을 하거나 무슨 아카데미를 나오거나 관련학과를 나온 사람들에 더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까지 능통한,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던, 또는 몸소 예술가였던 사람들까지…. A, B, C는 동시에 ‘맙소사, 십 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이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머리에 떠올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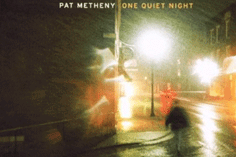
출처 www.amazon.com |
10여 년 전, 세 사람은 열정으로, 관심으로, 혹은 기대로 현장에 뛰어들어 일을 배웠다. 이런 일을 따로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었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이쪽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들이 문화예술계에 뛰어들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경력이나 경험,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용기와 꿈이었다. 그들의 용기와 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버티게 해주었는지….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A, B, C 세대만이 공유하는 최고의 안주이자 치료제이다.
같은 연배의 D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에 같이 서운해 하고, 실제로는 갈 마음도 없는 회사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에 괜히 설레고,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의 술자리가 언제나 그러하듯, 비장한 표정과 뜻 모를 위로로 서로를 격려하며 어색하게 헤어졌다.
그들은 모두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
|
 |
필자소개
계명국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LG아트센터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일하고 있다. 페이스북 |
|
|
|
 계명국 _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사무국장
계명국 _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사무국장
 NO.172_2012.04.19
NO.172_2012.04.19